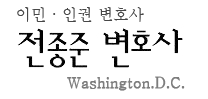장례식을 다녀왔다.
다른 장례식과는 달리, 이번 장례식은 특별한 의미를 느끼게 했다.
즉, 남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본 것이다.
보통, 입관예배시 자녀들이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손자들이 조사를 했다.
두 손자는 미사여구 없이 울음반, 말반 섞인 어투로 애정어린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토해냈다. 얼마나 손자들을 공평하게 사랑을 하셨으면, 할머니는 죽어서도 손자들에게 저렇게 인정받으실수 있었을까.
입관예배의 마지막 순서 중 유가족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돌아가신 노모의 장남이, 25년동안 노모를 대신 모셔준 막내 여동생과 매제에게, 눈물어린 감사를 표했다.
얼마나 막내 여동생의 헌신이 고마웠으면 어머니의 죽음앞에서 여동생을 저렇게 인정 할 수 있었을까.
입관예배후 막내 여동생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어머니를 모신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신 것 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섬김을 보았다.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값진 것이 였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딸자식에게 저렇게 인정 받으 실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구나. 인생이란 섬김이다. 그리고 섬김은 인정을 낳는다.
나는 안 죽을것 같아도 반드시 죽는 법.
그럼 내가 죽은 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멀리 있는 사람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아내,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는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초상집에 사람이 많고,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없다” 고 했던가.
직책이나 타이틀보다, 남을 섬기는 삶이 인정받는 장례식을 생각케했다.
장례식을 다녀와서, ‘인기’보다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그러면, 어느 94세 노모의 장례식처럼,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