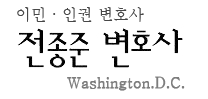-사람을 바꾸는 uThinking-
너는 나의 거울이다
동양이나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답게 사는 삶을 찾고 또한 나눔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치며 유띵킹을 재조명하고 있는 노영찬 교수를 만나 보았다.
한국에서는 한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노 교수는 미국대학에서 역설적으로 공자를 가르치고 유교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반 공자사상이 퍼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동양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동아시아가 1960년 이후 불과 50년만에 한국이나 일본,대만,홍콩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유교적인 성향을 가진 국가가 경제적인 부상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유교사상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연설식으로 하기보다는 현대적으로 기독교나 수교사상을 연결해서 가르친다고 한다.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큰 기대가 없다가 막상 배우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눈을 떳다고 고백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필자는 유띵킹 저서에서 “생각이 먼저가야 행동이 따른다”라는 이론을 정립하였는데 노교수는 생각이 존재를 바꾸어 준다고 했다. 생각이 자기 존재를 바꾸어 주고 존재가 바뀌어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됨으로 생각과 존재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유교사상에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그건 내가 먼저 수신하고 가족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와 세계를 생각하는 것인데 결국 나부터 시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던져보았다. 노교수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말인데 그 중심의 사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수신은 꼭 자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신속에 남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자기 수양을 위해서는 남을 알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수양할 수 없다는 것이다.즉,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양한다면 그건 수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수신 자체의 개념이 곧 우리다. 한국에서도 내집이라 안하고 우리집,우리학교라고 말한다. 그 우리가 바로 나인 것이다. 이미 내속에 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수신이라는 것이다.
마크 뮬러라는 종교학자는 “ 한가지만 안다는것은 한가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했다.
즉 나만 아는 사람은 나를 모른다는 것이다. 나를 새롭게 보기 위해서는 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너가 나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한국인이라는것을 의식하고 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외국에 와 살다보면 내가 한국인임을 느끼게 된다. 생김새가 틀리고 문화가 틀려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틀린 속에서 나를 다시보게 되게 되는 것이다. 동양철학에서는 유띵킹을 많이 강조한다고 한다. 남을 알고 자기를 알 때, 즉 양쪽을 다 알 때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가르친다.
노 교수는 동양철학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남을 이해하고 표용하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 동양 정신 문화회”를 18년동안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위에 몇몇분의 제의로 시작했고 1-2년 지나면 시쿤등 해지겠지 생각했는데 모두 열심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유띵킹은 축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 댓가를 바라기보다는 유띵킹을 할 때 이미 받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 노교수의 이야기이다. 이런 축복을 무시하고 너무 물질적인 축복에만 축복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노교수의 말에 수긍이 간다.
한인들이 근면성으로 미국에 와 빨리 성장하고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은 참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원적인 문화이고 다원적인 종교이고 자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인들도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다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너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유띵킹이며 글로벌 생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