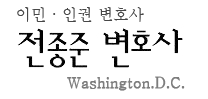법치주의 바로서면, 정당정치 희망있다
올해는 선거의 해. 한국에선 총선거,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선거철을 기다리는 사람과 국가가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해 국정수행을 못해 먹겠다” 이는 한국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 못했을 때마다 외치는 불평의 소리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소위‘철새 국회의원’이다. 심지어는‘철새 대통령’까지 등장했다. 왜 법의 테두리에서 정당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숫자로 문제를 밀어 부치려 하는 것일까?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그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보고 선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회의원 한 개인을 영입한다는 것은, 바로 그를 뽑아 준 국민의 신성한 표를 빼앗는 것과 같다.
정권이 바뀐 뒤, 대통령의 정당이 국회의 소수당이 되면 “너희 당이 그랬으니, 우리당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당 의원을 영입한다.
한국에선 여당과 야당의 개념이 미국과 다르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혹 야당의 의원들 중에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으로 따라 가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는가 보다.
그런 연유로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정당을 버리고, 새로 정당을 설립해도 그 정당이 새로이 여당이 되는 대통령의 정당이 되는가 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다수당(Mahority)이 된다. 즉, 그 정당에 대통령이 속해 있냐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정당이 여당이 되는 셈이다.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사가 속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생각은 틀리다. 미국민은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약속이나 한듯 공화당을 다수당이 되게 한다. 이를 통해 미국 국민의 정치문화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알수 있다. 한예로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 되었을 때, 40년만에 국회의 다수당을 공화당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해 독선을 막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라는 미국민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의 원칙이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대원칙인 것이다.
현재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하에서는 공화당이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의 부각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시정될지 지켜볼만 하다. 따라서 미국에선 철새 국회의원, 철새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없다.
클린턴 대통령 때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꾼 사례는 겨우 다섯건 전후였는데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에서 그 반대당으로 자리를 바꾼 것은 한인들에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결국 미국의 국회의원은 당리당략 때문에 정당을 바꾸지 않고, 이념으로 정당을 지키는 정치풍토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당정치를 이해하면, 미국 한인 동포 사회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 해야지 혹은 어떤 후보를 지지 해야지 하는 기준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