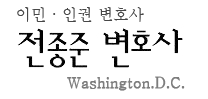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사법부까지 논란의 촛점이 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해야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는 일부 판사들의 행동은 국가기관간의 균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의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였다.
과연 법의 심판자인 판사가 마치 한미 FTA를 반대하는 데모 시위대처럼 찬반 논란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어도 되는 것인가?
개 인적으로 국제 통상 분야의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FTA의 전체적인 내용도 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감히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함부로 말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판사는 과연 그 분야에 전문가인지 먼저 묻고 싶다. 한미 FTA 쟁점 중의 하나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는 사법 주권의 포기이다”라고 판사는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쌍방주의 원칙에 의해 미국 또한 사법 주권의 포기를 동시에 뜻하는 것이다.
계약상 소송문제가 발생했을때 계약서에서 정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 엄청난 소송 비용과 오랜 기간 동안의 법적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의 추세는 법정 재판소보다는 국제 중재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미국 국내 계약서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경비 절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무역기구(WHO)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 즉 이것은 사법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양 당사국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의 대안인 것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글을 발표한 판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판사가 법복을 벗고 말할때 가능한 것이다. 법복을 입은 판사는 헌법상 기구중의 하나인 사법부에서 법을 해석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헌법상 판사의 양심과 개인적 양심과는 분리되며, 차후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정치적 현상이나 법에 대한 의견을 법정외에서 표현하는 것은 판사로서의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 전범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뉴덴베르크 재판 과정 중에 어떤 독일인이 한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사석에서 접촉했을때 그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 나는 법정 이외에서는 법을 논한 적이 없다”고… 판사는 모름지기 그렇게 재판정에서 법의 엄중하고 공평한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항상 그랫듯이, 한미 FTA 가 국회를 통과할때도 ‘폭력과 날치기’라는 비민주적인 단어가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표싸움 대신에 몸싸움을 하는 국회는 국민에게 몸싸움하는 것과도 같다. 떳떳하게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다수당이 되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정착될때, 비로서 국회 폭력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미 FTA의 찬반에 관계없이, 말없는 대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06
D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