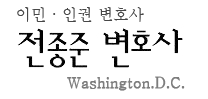한국에선‘영감님’으로 통하는 검사, 미국은 다르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가.
유독 한국에선 법모다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포도청장이 공포의 대상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검사가 그 자리를 물려 받은 듯하다. 그래서 검사의 칼날 앞에 영감님이란 소리가 나올 듯도 하다. 물론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아직도 한국에선 힘(?)을 쓸 수 있는 검사가 선망의 대상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사법연수원을 우수하게 졸업해야 검사 지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변호사를 해야 할 판이다.
한국에선 도대체 검사가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 그것은 바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수사할 대상이 있으면 경찰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수사가 끝나면 검사의 기소권을 통해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의 행사방향에 따라 수사의 대상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으나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검찰측은 경찰이 아직 수사권을 담당할 정도로 수준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하고, 경찰측에서는 수준이 높은 경찰 대학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갖춰 졌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검사에 대한 한국식 사고를 안고 미국으로 건너온 재미동포는 미국에서도 검사를 선호하는 것 같다.
재미동포 자녀가 검사로 임명되면 동포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도 하고 그 부모는 자식이 검사가 되었다고 한국식으로 자랑스러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검사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더 영향력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만 무서워하고 경찰은 우습게 보던 한국에서의 습성 때문에 미국에 와서 가끔 불이익을 당하는 동포도 있다.
미국 경찰이 수사권 행사를 통해 법을 집행할 수 있게된 것은 바로 경찰의 전문성과 고급인력 그리고 수준 향상 때문이다.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반 경찰관은 경찰 임용후 법집행과 수사권 행사에 관한 교육을 통해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은 지방자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경찰권에 의해 유지된다.
요즘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지방자치를 확대하려고 한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통한 치안과 질서유지가 뒷받침되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검사를 영감님으로 특별히 존칭하여 부르지 않는 것도 알아두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