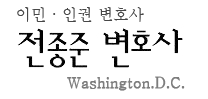최근 재외동포 전문가로 통하는 김성곤 전 국회의원이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워싱턴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다. “재외동포 2세들의 미래를 선천적 복수국적 같은 악법이 옥죄고 있다.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김성곤 평화 이사장은 “개정이 안되는데는 병역에서 예외는 안된다는 병역의무의 강제성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일명 ‘홍준표 법’에 의해서인데 원정출산을 막자는 취지였으나 재외동포 2세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게 문제다.”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아직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병역의무의 강제성’이 아니라, ‘잘못된 법의 무지’ 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실수로 병역의무의 강제성을 15년 동안 강조하다가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잘못된 법의 무지’를 시인했다.
2020년 결정에서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하였다. 즉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면서도 병역의무를 현실화 할 수 없다” 며, 한인 2세는 병역자원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장이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과 국민정서를 혼동한 병역의무의 강제성이란 구식 변명을 피력한 것은 법의 무지와 법 개정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특별 인터뷰에서 “홍준표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말햇다. 그러나 어떻게 고치겠다는 의지나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가끔 미국에 오면서 관심을 가지는 듯한 발언과 슬쩍 넘어가 버리려는 제스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김 이사장에게는 법 개정을 위한 10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던 것일까?
2014년 10월, 김성곤 의원이 주관한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나를 주 발제자로 초대하여 “해외 한인 2세 공직 진출 막는 한국 국적법”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그 뒤를 이어 법무부와 병무청 그리고 한국국적법 전문 변호사와 뉴욕 단체회장이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김 의원은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할 때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말소하게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도 결국 그는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 인터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과도한 규제는 손봐야 한다. 국익이 손해를 보는 일은 안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정말 이일에 관심이 있다면 최소한 이일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일에 12년 이상 매달리고 있는 나에게 한번쯤은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2021년 11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유대인의 경우 매년 5만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지만 한인들의 모국연수는 1천명에 불과하다”며 “미국 방문 중 한인단체장들의 협조를 약속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한인 2세가 모국 연수를 못하는 법적 이유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해외동포 차세대는 모국연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천적 복수 국적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5년 소위 홍준표 법에 18세 이상의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병역기피자가 되어 한국 방문이나 연수 갔다가 체포될까 두려워 못가는 법적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재외동포 전문가가 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보다는 한국의 인식을 이곳에 전달하기 바쁘다면 그건 이해가 어렵다. 정녕 김 이사장 및 재외동포청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뜻이 있다면 병역과 무관한 한인 2세의 해결책으로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정당성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건의하고 홍보해야 한다. 이제라도 미주 보단 한국에서 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 주길 당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