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에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에서 무슨 업무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했다. 스탠리 쿡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법을 배웠던 것이 기억났다. 처음엔 돈이 없어 광고를 못해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 곳도 없었던 상태에서 기도하며 이민법 관련 책을 독파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양마켓에서 발행하는 주간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상담 코너가 있는 걸 보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이민법 칼럼을 쓸 수 있다고 하니 편집장은 그렇지 않아도 교포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민법 기사를 쓸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던 중이라고 했다. 기사를 써주면 원고료 대신 5단반짜리 광고를 무료로 내주겠다고 했다. 비록 작은 주간지였지만 내 사진과 함께 이민법 칼럼이 나가자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1인 3역을 했다. 변호사, 변호사 보조원, 리셉셔니스트의 역할을 했다. 컴퓨터가 없어 중고 타자기를 100달러를 주고 구입해 이민국 양식 서류를 타이핑했고 변호사 편지도 일일이 다 처리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습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됐다.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이민법 기사를 정리했다. 내가 쓰는 글이 지금은 주간지에 실리지만 언젠가 책으로 발간되어 많은 이들의 길잡이가 되길 바랐다. 주간지에 칼럼이 실리면서 전화 상담도 차츰 많아졌고 사무실에 찾아와 사건을 맡기는 클라이언트도 늘기 시작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로 자리 잡게 됐다. 일이 바빠지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컴퓨터도 구입해 사무실로서의 모양새를 차차 갖추어 갔다.
1994년 한국 최초의 미 이민법 책 ‘알기 쉬운 미국 새 이민법’을 출간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워싱턴에 유일하게 있었던 한인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민 상담을 하게 됐다. 그 사이 둘째아들 제이슨이 태어났다. 이후 95년 ‘미국은 가깝다’란 이민법 사례집을 출간했다. 이후 ‘공자는 미국에 있다’ ‘당신도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등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이전 책도 그랬지만 책의 인세는 모 단체에 기부해 선한 일에 쓰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던 중 이민법에 관련된 최초의 인권 이슈가 나타났다. 그것은 주한 미 대사관의 차별적 비자 발급 관행에 대한 시정이었다.
당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방문비자(B-2)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통례였다. K씨는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산가족이 돼야 했다. 그때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OF-156’이라 했고, 신청서엔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란 두 가지 질문이 있다. 방문비자를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단지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문비자를 거부당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액션을 취하기로 했다.
K씨의 방문비자가 거절 된 후 이틀 만에 나는 미 대사관 총영사에게 변호사 공문을 보내 K씨는 방문 후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미 대사관의 비이민비자과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비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난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과장은 99년 11월 16일자 공문에 영주권 신청자는 한국과의 ‘극도의 강한 연대(unusually strong ties)’를 밝혀야만 방문비자를 내줄 수 있다고 했다. 이 편지 하나 때문에 난 약 4년 동안 법적 투쟁을 했고 결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벌이게 됐다.
정리=이지현 기자 jeehl@kmib.co.kr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668306&code=23111513&sid1=f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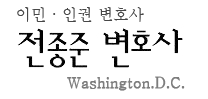
![[역경의 열매] 전종준 (8) 교포사회 돕기 위해 이민법 개선 앞장 기사의 사진](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1/0222/110222_35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