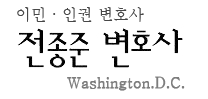?![[역경의 열매] 전종준 (3) 영어 못해 사법시험 낙방… 오기로 미 유학 기사의 사진](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1/0215/110215_35_3.jpg)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만 해도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반드시 외국어를 선택해야 했다. 외국어에 소질이 없는 난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해온 영어를 하기로 하고 노력했지만 어려웠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본이 부족한 영어를 법대 시절에도 소홀히 했다. 좋아하는 법률 공부에만 열중하다보니 영어가 문제였다.
대학 3학년 때 처음으로 사법고시 1차 시험에 응시했다. 시험과목 중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떨어졌다. 그런데 영어에서 과락을 했다. 대입 예비고사 낙방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어떻게 영어를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영어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어휘력 독해력 문장력 그리고 문장구조의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다. 사법고시 2차 시험은 법 과목만 주관식으로 묻는 시험이기에 자신이 있었지만 영어가 장애물이 돼 더 이상 나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하루아침에 정복할 수 없는 영어가 원망스럽고 원수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4학년 때 사법고시 1차 시험에 다시 도전했으나 또 영어가 내 발목을 잡았다. 이번엔 졸업 전에 사시를 통과한 친구들이 셋이나 나왔다.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았다.
“하나님, 나의 앞길을 책임지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 제가 갈 길은 어디입니까? 그토록 하고 싶었던 법 공부이지만 영어 때문에 실패를 계속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아무리 절규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친구들은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를 패스해 사법 연수원생이 되었다. 계속되는 실패에 숨고 싶었다. 그래도 계속 사법고시에 도전하려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진학했다. 친구들이 사법연수원생으로 법조인 훈련을 받을 동안 나는 대학원생이 되어 다시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른바 ‘대학원 특례법’이란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대학원 재학생은 군대를 연기하고 해외 유학을 허용하는 법률이었다. 영어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내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새로운 법을 기회로 삼고 미국 유학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미국 유학은 내가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자! 미국으로.”
83년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에 있는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에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떠나올 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겠냐”며 말리는 교수들도 있었지만 당시 유학은 사법고시에 떨어진 자존심을 조금 회복시켜주는 듯했다.
미국에 도착한 첫 번째 주일 한인 교회에 나갔다. 교민이 많지 않은 오마하는 교회도 무척 작았다.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한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치 집으로 돌아온 편안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내 영어는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안 되는 ‘콩글리시’에 손짓, 몸짓으로 학교 등록도 하게 됐고,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내가 바로 그 짝이었다. 날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편안함 때문인지 뻔뻔할 수 있었다. 말 못하는 나보다는 못 알아듣는 그들이 더 답답할 것이라는 배짱까지 생겼다. 조각조각 단어만 이야기해도 미국 사람들은 퍼즐을 맞추듯이 내 영어를 알아듣고 일을 해결해 주었다. 드디어 영어가 처음으로 가까운 친구로 보이기 시작했다.
정리=이지현 기자 jeehl@kmib.co.kr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643079&code=23111513